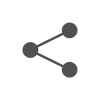바다에 대한 나의 기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학시절 친구 따라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을 돌아 본 것이 고작이고, 결혼 후에 서너 번 바다에 간 것 외에는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여행, 특히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그렇다고 내가 바다나 여행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내가 바다 대신 어느 산속의 계곡에 발 담그고 자연을 벗 삼아 여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움직이는 자체를 싫어하는 나에게 그런 일은 요원한 일이다. 그런 나를 아내가 좋아할 턱이 없다.
남들은 좋은 구경이 있으면 해외든 국내든 개의치 않고 어디든지 쉽게 가방 둘러메고 나서지만, 나는 집주변이나 어슬렁거리면서 눈에 익은 풍경을 구경하고 느끼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다보니 친구들은 나에게 역마살이 낀 것 같다고 했었다. 지금이야 오십 중반을 달리는 나이라 시들어 버렸지만 젊은 시절에는 곱상한 외모 덕분에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았던지라 나의 역마살은 좀처럼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처음 기억에 떠오르는 바다는 서해안 만리포·천리포이다. 내가 사는 곳이 대전이다 보니 서해안까지는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고 교통편도 그리 어렵지 않아 여름철이면 찾아가는 단골메뉴였다.
어느 날, 친구들과 대전 역에 모여 궁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고 서해안 만리포로 출발하였다. 도착하고 보니 우리 호주머니에는 돌아갈 차비만 남아 있었다.
젊었던 우리는 패기만 믿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바닷가에서 로맨스라는 보트를 몰아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급료는 하루 식사와 잠자리 하루 용돈 오백 원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약간의 여비였다.
보트는 저녁 밀물에 들여오고 아침 썰물에 밀어냈는데, 피서객 중 혼자 오는 손님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태워주면 되는 일이었다. 보트는 한척의 무게가 250킬로라 아침저녁에 한 번씩 밀고 다니느라 애를 먹었다.
보트 태워주는 일은 보트가 조금만 먼 바닷가로 나가면 위태로운데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졌고, 보트가 뒤집어져 애먹던 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능숙해졌다.
여름 바다날씨에 얼굴 타는 것은 친구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선크림으로 해결했다. 젊은 대학생들이라 아가씨들에게도 인기가 참 좋았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몰려다니면서 오백 원으로 아이스크림과 무료 나이트에서 저녁의 해수욕장을 만끽하였고, 술 한 병에 김치쪼가리를 안주 삼아 바닷가의 밀물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미래와 알지도 못하는 철학과 종교 그리고 정치이야기를 하다보면 해수욕장의 밤은 금방 깊어진다.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옥상에 올라가 애드벌룬을 끌어당겨 내 가슴에 품었다 내놓았다하며 바라보던 하늘은 왜 그리 아름다운지, 나는 서해안의 무전여행을 즐길 때 그 넓은 바다를 쳐다보며 보트를 몰던 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비록 지금은 궁핍을 면하려 돈을 좇아 바삐 다니고 있지만 그곳 바다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바다의 소리가 있다. 바다는 고동을 타고 지금도 나의 귓가에 대고 소리친다.
“이번 더위에 너 한번 친구들과 다시 오지 않을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 노총각의 죽음과 카메라 - 2021-08-29
- 아파도 너무 아팠던 족저근막염 치료 후기 - 2019-10-29
- 어머니 도시락 - 2018-09-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