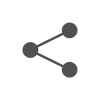아침에 회의실을 점검하고 잠시 쉬고 있으려니 핸드폰의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의 귀를 울렸지요.
“반장님, 오늘 아침 새벽에 형이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다음 주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알았다고 간호 잘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니 오늘이 금요일, 입원한 지 두 달 만에 회사로 출근한다고 얼마 전 저와 통화를 하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와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이런저런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혼자 하기엔 벅찬 업무다 보니 항상 지쳐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고 그런 저에게 회사는 월급을 올려주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요.
물론 처음부터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일복이 많아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하다 보니 어느덧 혼자서 열다섯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던 중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회사로 장애우 단체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들어온 직원 가운데 경증인 환자가 저와 함께 업무를 보게 되었어요. 40세 중반에 노총각이라는데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우람한 체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저의 두 배 되는 체구이기에 그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지 궁금하였어요.
그는 과거 인쇄소에서 전자 기술자로 일하던 중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고 현재는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두 번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와 일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이 건강이여.” 하며 건강을 챙기라고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곤 하였어요.
그는 무던히 노력하더군요. 월급도 그에겐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예전의 월급에 비하면 턱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기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는 주일에 쉴 때면 차를 몰고 길을 떠나 이 경치 저 경치를 사진에 찍어오는데 여간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그 솜씨가 탐이 나서 “나 카메라 기술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사진을 잘 찍어요?” 했더니 그는 웃으면서 “반장님,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안 쓰는 카메라 한 대가 있는데 반장님이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세요.” 하더군요.
그렇게 카메라 한 대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메고 다니려니 힘도 들고 찍는 것도 서툴러 집안에 처박아놓았지 뭡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는 운 좋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기뻐했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을 거에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일이야 항상 제가 혼자서 도맡아 해오던 것이고, 그를 대신해 그의 동료가 일을 해주니 별로 어려움은 없었지요.
그렇게 그는 신장 이식 후 퇴원해서 회사에 다시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수술 후에도 그의 건강 상태는 별반 좋아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부작용이 생기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어요. 성인의 큰 남자에게 어린 처녀의 신장을 이식한 것이 문제였는지 부작용으로 다리 뼈가 기형적으로 자라게 된 것이었어요. 그는 신장 이식을 한 것을 후회하곤 하였지요.
그가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려니 여간 긴장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어려운 일은 혼자서 감당하려 노력했는데 그런 저에게 그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사이 카메라는 저의 방 한구석에서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쓰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다시 원래 주인에게 보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부작용으로 긴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기 전 다시 완쾌되어 나올 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이요.
그는 입원 중 항상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그의 진정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입원 중 언제나 돈 걱정을 하였지요. 살림이 썩 좋지는 않다 보니 그랬을 테지요.
어느 날 퇴원 후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서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저 먼 세상으로 떠난 거죠.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40대의 제 동생을 뇌출혈로 잃었는데, 또 40대의 동료를 잃게 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시간은 무정하게 또 흘렀지요. 순간순간 생각이 나지만 언제나 그의 좋은 모습만 남아 맴도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못가에서 또 다른 장애우의 모습을 보니 그가 떠오르네요.
“반장님, 저 여기 그만두면 일할 데가 없어요. 저는 일을 해야 먹고살아요.” 요즘처럼 경기가 힘이 들 때면 정상적인 사람도 자리 잡기가 힘든데 장애를 갖고 혹독한 세상과 마주 선 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는 복지에서 복지로만 가는 것 같은데 과연 복지란 것이 현실에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한구석에 뿌옇게 먼지를 뒤집어쓴 카메라를 보고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봅니다. 그가 저에게 남긴 유품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한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러봅니다.
이제 제가 그를 위해서 해줄 일이란 이 카메라를 들고 그와 호흡을 맞추어 일할 때처럼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는지요. 카메라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며 셔터를 눌러봅니다.
- 노총각의 죽음과 카메라 - 2021-08-29
- 아파도 너무 아팠던 족저근막염 치료 후기 - 2019-10-29
- 어머니 도시락 - 2018-09-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