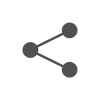저녁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1905~1977)
내가 지금이야 트로트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나이가 됐지만, 한때 트로트의 ㅌ도 입에 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방이라도 갈라치면 여간 난감하지 않았다.
트로트는 박자가 일정해서 손뼉 치기에 좋고, 흥을 돋우기에도 좋으나 나의 18번이나 19번들은 죄다 포크송 아니면 록이어서 당최 사람들과 흥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되도록 노래방 가는 것을 피했는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녹록하던가. 피치 못하게 노래방에 갈 일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게 인생이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했던 설날. 처갓집에 갔더니 형님들과 손위동서들이 저녁에 나를 노래방으로 안내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노래 한곡 부르던 노래방만 몇 번 갔던 내게 번쩍번쩍하는 조명이 있었던 그 노래방은 아방궁처럼 보였다.
하여간 그런 멋진 노래방에서 건배란 것을 하고서 서열순으로 노래를 한곡씩 하는데 나오는 노래마다 반주가 뽕짝~ 뽕짝 하는 것이 죄다 트로트다. 남인수도 나오고, 배호도 나오고, 김정구도 나온다.
드디어 내 차례. 나는 멋모르고 하남석의 ‘바람에 실려’를 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노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해맑은 얼굴로 노래를 시작했고, 신참에 대한 배려인지 기대인지 모르겠으나 다들 집중하며 손뼉으로 호응을 해주는데, 아뿔싸~ 몇 소절 지나지 않아서 이 노래가 손뼉으로 박자 맞추기가 극악하리만큼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애초 ‘바람에 실려’와 같은 노래는 눈을 지긋이 감고 감상하는 노래지 손뼉 치며 흥을 돋우는 노래가 아닌 것이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법.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안다. 관중의 반응이 어떤지.
그때 공간을 가득 채운 건 난감한 페르몬이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손뼉을 치는 사람이나 미치도록 힘든 시간이었고, 이었을 것이다.
나로 인해 조성된 어색함은 다른 동서들이 살신성인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수습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 고초를 겪고서 짧은 시간 만에 찾아낸 노래가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이산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詩)에 작곡가 이세문이 곡을 입힌 노래인데, 나의 정서론 그나마 신나는 축에 들어가는 노래이다.
여기저기를 거쳤다가 다시 나의 손으로 돌아온 마이크. 나는 조심스럽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선곡했고, 드디어 반주가 나왔다. 그리고 성공을 직감했다. 경쾌하게 시작되는 반주에서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노래 역시 반주에 맞춰 손뼉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흥겨운 분위기는 해치지 않으니, 나에겐 노래방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게 해주는 고마운 노래라 할 수 있다.
요즘은 시골을 제외하면 저녁에 하늘의 별을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지만, 이 노래가 사랑받던 그 시절엔 하늘의 별구경 하기가 참 쉬웠다. 그래서인지 ‘저녁에’라는 시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
‘저녁에’를 읊조릴 때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부를 때면 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더라도 정답게 두 손 마주 잡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일 거다.
- 듕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 2021-09-25
- 작품성이 엿보였던 영화 자산어보 - 2021-09-24
-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 2021-09-12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