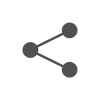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뉴욕타임즈 평론가들이 선정했던 2018년 올해의 책’, 어느 유튜버가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바로 이 책이라고 했던 책, 샐리 티스데일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책은 어머니께서 여러 번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또 요양병원에 누워계신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궁극적 질문이 ‘죽음’ 아니던가.
요즘 ‘중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중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떻게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흔히 생각하는 돈, 친구, 취미, 건강에 대한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날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음에도 ‘나는 예외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아프리카의 초원, 사자가 사냥을 시작하자 누우떼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사자에게 잡히자 누우떼는 다시 평화 속에서 풀을 뜯는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잘 아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혹하다가도 나와 무관한 것처럼 지내는 게 사람 아니던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완화의료팀 간호사로 10년 넘게 일한 저자의 경험과 지식이 담겨 있다. 저자는 우리 삶의 중심엔 늘 내일이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키케로의 말을 인용한다. “철학적으로 사색한다면 죽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고대 로마인은 죽은 사람을 ‘빅싯(Vixit)’이라 불렀다는데 이는 ‘다 살았다’라는 뜻이고, 볼리비아의 레이미족은 사람이 죽으면 ‘고추재배 하러 갔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돌아가셨다’라고 한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저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소개한다. 상당수는 부검으로 신체가 훼손될까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못 볼 꼴을 보일까 봐 우려하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다가 죽는 게 제일 복이라고 말씀하신다. 과연 그럴까?
주삿바늘을 두려워하고, 관에 안치된 상태에서 눈을 뜨거나 땅속에 묻힌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될까 걱정하기도 한다. 나는 이 대목에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렸을 때 이 걱정 하느라 악몽도 꾸기도 했으니 말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처는 여러 제자를 납골당에 보내어 시체 명상을 하게 했고, 몽테뉴는 죽음을 자주 생각해서 죽음이 삶과 잘 어우러지게 하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누구나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할까?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미국 성인 3분의 2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오래 사는 것보다 고통 없이 평안하고 차분하게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규정한다고 한다.
좋은 죽음에는 흔히 가족, 친구,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포함된다. 병상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심장발작, 출혈, 의식 없음이 반복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통 중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좋은 죽음이란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품위를 잃어버릴까 몹시 두려워한다. 게다가 죽음 이후의 결과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존엄사’라는 말을 그럴듯하게 붙인 것인가.
요즈음은 인생의 말년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시내 곳곳에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입원환자가 넘쳐난다. 어머니를 잠시 모셨던 병원도 200명 수용인원이 꽉 차게 운영되고 있었다.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그곳에 누워계신 분들이 온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곤 했다.
중년이 지나면 곧 노년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 병상에 누운 후에 후회하지 않을 그 무엇은 무엇일까?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해야 하지 않는가?
한낱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다가는 큰 화를 당하기 마련이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바로 나라고 말했다. 영혼을 모른다면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용서하자.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인정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스스로 한탄하고 미워했던 나날들, 그러나 과거는 그만 놓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중년의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움과 분노로 평생을 산다면 너무 억울하다. 나도 이 시간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아픈 과거가 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분은 “두려운 사람 하나 없고, 미운 사람 하나 없다”라고 했다. 진정 좋은 죽음이다.
조물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야말로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을 통해 죽어감과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을 감사한다.
- 최도현의 전원일기(8) 알밤을 주우며 - 2021-09-26
- 최도현의 전원일기(7) 세종시 로컬푸드 싱싱장터의 초보 장사꾼 - 2021-09-08
-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실질적 조언 - 2021-08-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