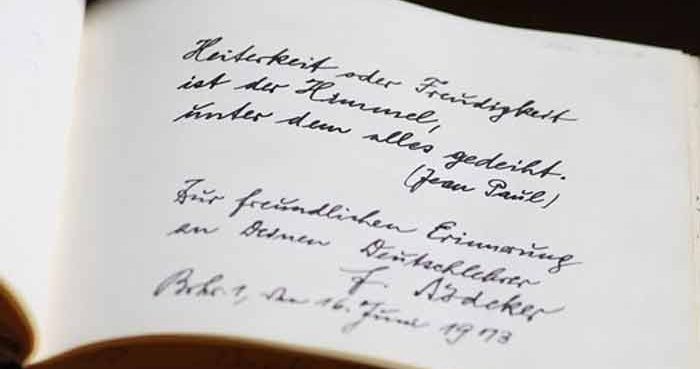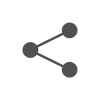나는 차를 세우고 내려 조금 걸었다. 거리는 말랑말랑한 촉감의 물질로 포장되어 있었다. 한번도 느껴본 적 없는 신비한 소재였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온천수처럼 뜨거운 비였다. 나는 근처의빨간 공중전화 부스로 일단 몸을 피했다. 대찬 소나기였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서서 머리카락의 물기를 털고 있을 때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비를 맞으며 잰걸음으로 다가 왔고 그는 서슴없이 내가 있는 부스 문을 열어젖혔다. 나는 남자도 비를 피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조금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런데 그는 다짜고짜 주머니에서 뾰족하고 번뜩이는 칼을 꺼냈다. 주방용 식칼 정도 되는 왕성한 크기였다. 제기랄, 강도인가? 나는 강도를 만났을 때의 기본 매뉴얼처럼 번쩍 손을 들었다. 좁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선 피할 곳도 마땅찮았다.
“가지고 있는 시(詩) 다 내놔!”
그가 말했다. 가지고 있는 시라니. 돈을 잘못 말하는 거 아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응?”
그는 더 큰 목소리로 “가지고 있는 시 다 내놓으라구!”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는 이해할수 없어서 무서워졌다.
“없…… 없는데.”
“없어?”
사내의 가난하고 처절한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사는 인간이 시를 가지고 다니기 어렵잖아. 1980년대도 아니고 요즘 누가 시를 끼고 다닌단 말인가. 강도인 주제에 정신병까지 걸려버린 듯한 사내와 좁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마주치는 건 대단한 불운이다. 문득 무서운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지금 써.”
나는 사내의 말에 난감해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만들었다. 그때 칼이 내 배에 2밀리미터 정도 박히기 시작했다. 강도의 의지는 광화문 네거리에 서 있는 이순신 동상보다도 확고해 보였다.
“잠깐, 잠깐만. 대체 어디다 써?
그러자 남자는 입가에 쓰디쓴 주름이 생기도록 이를 꽉 깨물었다. 그의 찢어진 눈빛은 내 배 쪽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양복 입은 새끼가! 필기도구도 안 들고 다녀?”
강도의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게 펜도 종이도 없다는 사실이 우선 무척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 손으로 칼을 들이댄 채 능숙하게 뒷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그것은 접이식 지갑처럼 보였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펜촉이 날카로운 만년필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난 시 못 쓰는데…….” 사내에게 말을 하려 했으나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배 쪽의 날카로운 금속이 그 예기를 한층 더 했기 때문에 차마 내뱉지 못했다. 무조건 써야 한다는 생각이 정신을 지배해버렸다.
“지금 쓸 테니. 칼 좀 치워줄래요?” 사내는 칼을 살며시 옆으로 거두고, 눈빛은 그대로 두었다. 누렇게 색이 바랜 수첩이었다. 나는 참고하기 위해 몇 장을 살짝 훑어보았으나 그 안에 적힌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대체 뭐라고 써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차라리 날카로운 만년필로 남자의 목을 찌르고 달아날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내가 카악 하고 위협적으로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그것은 내 구두 옆을 살짝 비껴갔다.
“비가 오구 지랄이야!” 음산한 목소리였다. 나는 뭉그적거리다 사내에게 ‘저기, 무엇에 대해 쓸까?’라고 말하여 했으나 사내의 음산한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정말 뭐라고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사내가 돌연 내 머리를 힘껏 후려갈겼다.
“이 새끼야, 시간 없어!” 나는 머리 쪽에서 느껴진 통증에 얼굴을 앞으로 숙였다가 공중전화 부스 밖, 땅 위에 떨어지는 비를 보았다. 빗줄기는 죽죽 선을 그으며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문득 누가 썼던 것인지 모를 문장 몇 줄이 생각났다
비가 내린다
비가창살처럼내린다
내리는비가감옥을만든다
치마아래예쁜다리는감옥의열쇠
나는 단숨에 한 연을 써내려갔다. 사내는 내가 쓴 글을 바라보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번째 줄, ‘내리는’은 빼. 비가 올라가기도 하냐?”
나는 사내의 말대로 ‘내리는’이라고 쓴 부분에 줄을 죽죽 그었다.
“확실히 지워, 새끼야.”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행이었다. 이상한 곳이지만 경찰은 있는 모양이었다. 사내는 흠칫 긴장하면서 수첩을 낚아채고 내게 날카로운 눈빛을 잠시 흘렸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씨팔, 네번째 행은 완전 개판이야. 갑자기 예쁜다리가 뭐? 아우 씨팔.”
그리고 그는 빗속을 뚫고 달아났다. 사내의 발바닥이 땅에 닿을때마다 빗물들이 위로 튀어 올랐다. 나는 ‘저것 봐, 비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잖아!’라고 중얼거렸다. 사내의 젖어버린 어깨선이 공포심 같은 실루엣을 남기며 사라져갔다.
박상 《이원식씨의 타격폼》
*****
나는 이 글을 읽고 틈틈이 시 적는 연습과 필기구는 꼭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다.
- 듕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 2021-09-25
- 작품성이 엿보였던 영화 자산어보 - 2021-09-24
-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 2021-09-12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