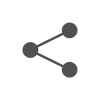밤 동안의 일을 마치고 새벽녘에 게이트를 통과해서 문을 여니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저씨들이 빗자루로 낙엽을 치우고 있었다. 두툼한 장갑과 겨울파카를 입고도 입에서는 연신 뜨거운 입김이 모락모락 난다. 아마 저 두툼한 파카를 벗으면 가슴에도 목 언저리에도 땀이 흥건할 것이다.
오늘같이 날씨가 추우면 제일 먼저 느낌이 오는 곳이 발이다. 손은 빗질을 하느라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은 아니다. 냉기가 발속으로 엄습해온다. 오늘도 그들은 어둠을 깨우고 있다.
나는 어쩌다 밤잠을 못 이룰 때 두툼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다. 어두운 거리를 다니다가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앉아서 명상하는 버릇이 있다.
그날도 밤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 네 시경 밖으로 나갔다. 날씨는 오늘처럼 춥지 않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쯤 되었던 것 같다. 밤거리를 걸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쩌다 돈이나 지갑을 줍는 경우가 있다. 나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부터는 걸을 때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을 보고 걷는다. 횡재수가 있을까 싶어서다.
그날도 나는 눈을 밑으로 깔고 현미경으로 물체를 감별하듯 바닥을 샅샅이 뒤져갔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날도 들리는 소리건만 그날은 유난히 박동감이 느껴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눈앞에 파란색 음식물 쓰레기차가 보였다.
두 사람이 연신 음식물바구니를 기계에 걸어서 치우고 있었다. 그쪽으로 다가서니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독한 냄새,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냄새가 언젠가 운전 중 창밖에서 맡아지던 농촌의 인분 냄새 같아서 정겨움에 그 음식물 쓰레기차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잡히는 순간, 나는 갑자기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힘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입에 마스크를 쓰고 연신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에 담고 있었다. 그 곁을 지나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언젠가 세차장에서 겨울에 미친 듯 차를 닦고 있는 나를 보는 것만 같았다.
남이 잘 하지 않는 직업만을 했던 나는 자신이 천박하다는 자괴감에 여러 번 빠지곤 했다. 그런데 그날의 인부 두 명이 나에게 무슨 지도자 아닌 지도자로 보일 줄이야.
우리는 아니 나는, 내가 험한 작업을 할 때 손님들이 다가와 “참 힘들죠?” 하면서 짓는 웃음이 참 역겨웠다. 왠지 나를 놀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너 한번 해봐라, 기분이 어떤지” 하면서 은근히 신경질을 낸 것도 사실이다. 내가 그런 심정 이었으니 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일하는 분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이 그들 두 명의 인부들 때문에 깨질 줄이야. 내가 보기에 그들은 이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내가 했던 그동안의 고생과 고통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리라. 나의 몸으로, 나의 발로, 이 도시를 새롭게 단장하리라 하고 마음속에 부르짖어본다.
나도 모르는 미소가 입가에 번져 오른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날씨가 춥다. 그러나 나는 저기 빗질을 하면서 하얀 입김을 뿜고, 가슴에는 땀을, 발에는 냉기를 갖고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좋다. 오늘 저녁의 어둠은 어김없이 깨어진다. 봄철에 얼음장이 녹고 깨어지듯이.
- 노총각의 죽음과 카메라 - 2021-08-29
- 아파도 너무 아팠던 족저근막염 치료 후기 - 2019-10-29
- 어머니 도시락 - 2018-09-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