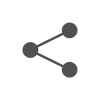나는 아침에 출근하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하나 입에 물고 연못가로 나가곤 한다. 연못 가까이에 가면 밤새 쉬고 있던 기러기들이 깨어나 후두둑 물을 차고 새벽어둠속으로 날아간다. 왠지 기러기들에게 미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담배를 끊을 정도로 심하게 미안한 것은 아니어서 그저 약간의 미안함만 가지고서 매일 연못가에서 담배 한 대씩 맛있게 피우고 있다.
어릴 적에 새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십자매며 잉꼬 등을 키우곤 하였다. 그러다 보면 순간의 방심으로 십자매와 잉꼬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일 년 이상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워도 한번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보며 은근히 날아가 버린 새들을 원망도 해보았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새를 키우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주위에 보이는 새들을 쳐다보는 재미로 키우는 재미를 대신하고 있다. 나뭇잎이나 줄기에 앉아있는 예쁜 새를 보면 왠지 지저귀는 소리라도 듣고 싶은 생각에 가까이 다가서서 귀를 쫑긋 세우곤 하는 것이다.
집 주위에는 과거 구석기시대의 움집터가 있는 선사유적지가 있다. 나는 오전이나 오후시간에 그 주위를 산책하곤 한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나무들도 좀 심어져 있는데 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비록 귀한 새는 아니지만 눈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분으로 나뭇잎 사이에 숨어있는 새들을 레이더에 걸린 비행물체마냥 찾아내곤 하면서 산책을 즐기는 것이다.
새를 찾아낼 때에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이름도 모르는 새들과 함께 나의 마음을 쉬어주는데 새들은 인기척을 느끼면 즉시 다른 나무로 날아가 버리곤 해서 씁쓸해지기도 한다. 지금도 새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내나 조류독감 문제만 아니라면 그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싶다. 그것이 안 되니 산책로 등에서 새들을 찾는 것이다.
언젠가 집 주위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무슨 재미난 것이 있나하여 가까이 가본 적이 있었다. 거기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어른이 참새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원래 참새는 경계심이 강해 사람의 기척만 나도 날아가 버리는데 그 어른 주위의 참새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발밑까지 와서 놀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신기하여 참새가 나 때문에 날아가 버릴세라 조심조심 그 어른에게 다가섰다. 신기하게도 참새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발밑에서 놀고 있는 참새 떼를 지켜보다 “어떻게 참새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정년퇴직하고 재미삼아 공원에 나와 참새에게 모이를 주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놈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 발이며 어떤 때는 무릎까지 올라와서 논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이 오면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놈들도 사람 볼 줄은 아는가보다. 그래도 나는 가까이가도 날아가지 앓으니 속으로 내가 나쁜 놈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러나 항상 새가 사람에게 편안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나의 기억 속에 아주 무서운 한 장면이 있다. 이년 전 내가 집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 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쪽으로 혼자 걷고 있었다. 초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서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입에서 연신 뜨거운 김을 토해내며 갑천 길을 걷고 있었다.
갑천의 물을 보며 그곳에서 노는 두루미를 쳐다보고 걷고 있는데 나와 함께 산책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두루미 한 마리가 나를 따라 나란히 날았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터라 별로 경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갑자기 두루미가 내 쪽으로 날개를 확 피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데 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두 주먹을 잔뜩 움켜쥐고서 얼음이 되어 있는데 순간 그 두루미는 내 머리 위로 날아가 버렸다. 나는 너무 놀라 그때부터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렇다고 새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단지 큰 새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조심성 하나가 늘었을 뿐이다.
내가 본 새 중에서 가장 예쁜 새는 단연 파랑새였다. 현충원에 있을 때 파랑새를 봤는데 동화속의 파랑새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다. (참고: 국립현충원의 야생동물)
그때 파랑새는 나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날아갔다. 지금도 그 파랑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수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는 사실이 나를 즐겁게 한다.
저기 조그마한 새가 나무 위에서 놀고 있다. 나는 또 다가선다. 오늘도 도심 속의 새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준다.
- 노총각의 죽음과 카메라 - 2021-08-29
- 아파도 너무 아팠던 족저근막염 치료 후기 - 2019-10-29
- 어머니 도시락 - 2018-09-16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